어쩌다 정치 유튜브를 눌렀다.
처음엔 그저 궁금했다.
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추지 않는다.
계속 보고,
계속 분노하고,
계속 추천된다.
그리고 문득 깨닫는다.
“이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네.”
정치 콘텐츠는 더 이상 뉴스 해설이 아니다.
지금은 **분노와 증오를 소재로 삼는 거대한 ‘비즈니스’**다.
유튜브에서 수익이 되는 키워드는 대부분
‘정치, 혐오, 분열, 선동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.
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.
“정치 유튜브는 왜 그렇게 돈이 되는 걸까?”
그 구조 속에서 나는 정말 ‘보는 사람’일까, 아니면 ‘이용당하는 감정’일까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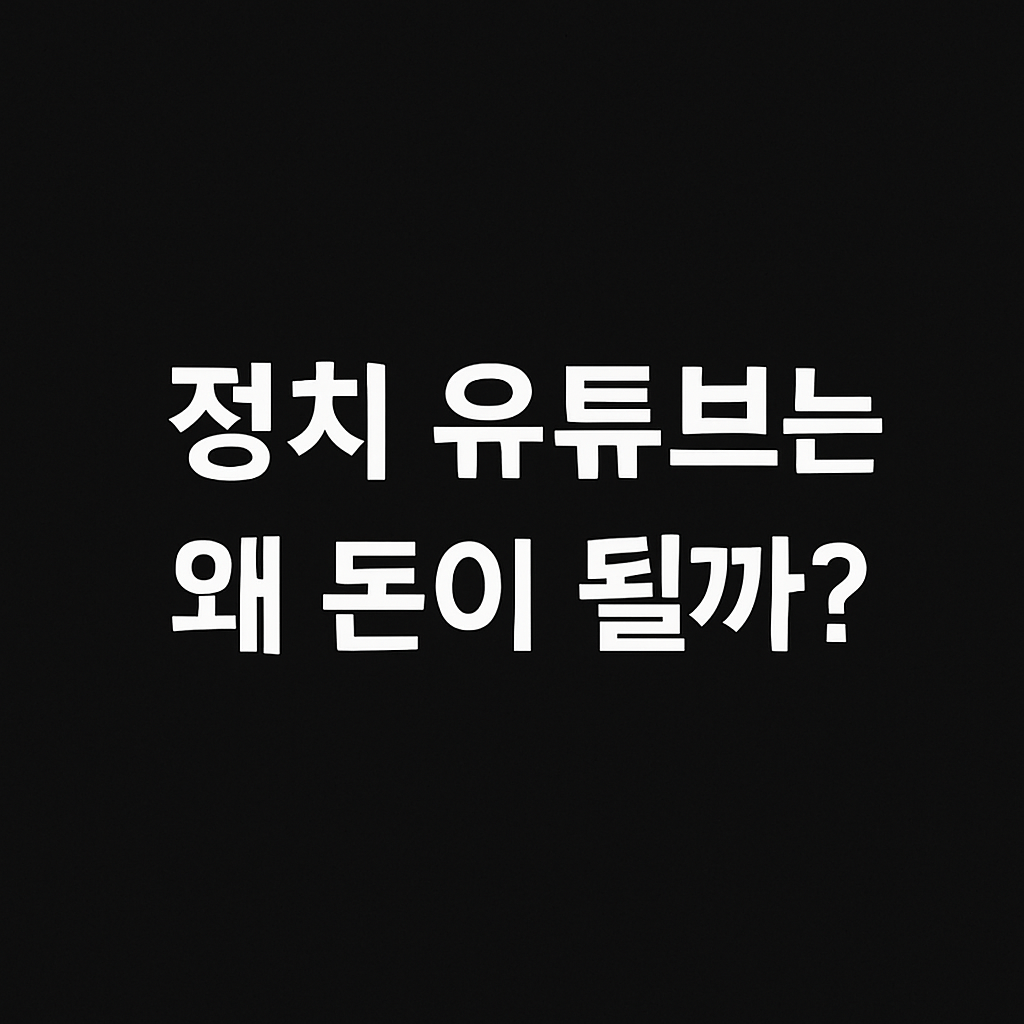
1. “자극은 클릭을 만든다” – 정치 콘텐츠의 시작점
어느 날 유튜브를 켠다.
“○○당 실체 폭로”
“대한민국 망한다”
“정치인은 전부 쓰레기”
썸네일 속 붉은 글씨, 분노에 찬 목소리.
그리고 그 영상은 조회수 30만 회를 넘긴다.
우리는 알고 있다.
자극적일수록 클릭이 된다.
정치 유튜브는 이 단순한 알고리즘의 감정 버튼을 정확히 누른다.
이념도 중요하지만, **‘화나게 만드는 기술’**이 더 중요하다.
정치는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다.
그래서 더 민감하고, 더 쉽게 분노하게 된다.
그 감정은 **‘즉각적인 반응’**을 만들어낸다.
그리고 그 반응은 곧 수익이 된다.
⸻
2. “가짜라도 괜찮아” – 돈이 되는 건 진실이 아니다
유튜브는 콘텐츠당 광고 단가가 다르다.
정치, 금융, 고위험 키워드는 평균 CPC(클릭당 수익)가 높다.
정치 유튜브는
• 높은 클릭률 (자극성)
• 높은 광고 단가 (시사, 사회 이슈)
→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고수익 구조다.
문제는 여기서 생긴다.
“진짜 정보”가 아니라
“더 자극적인 정보”가 더 많이 퍼진다.
그래서 어떤 이들은 ‘사실’보단 ‘믿고 싶은 감정’을 파는 콘텐츠를 만든다.
그게 설령 왜곡이라도,
조회수가 보장되면, 수익은 따라온다.
⸻
3. “알고리즘은 중립이 아니다” – 증오를 키우는 기술
우리는 종종 유튜브는 공정한 기술 플랫폼이라 생각한다.
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인간의 편향된 감정을 계산해 작동한다.
• 당신이 ‘좌파 비판 영상’을 오래 보면,
→ 더 센 ‘좌파 혐오 영상’이 뜬다.
• 당신이 ‘보수 유튜버’를 구독하면,
→ 더 극단적인 보수 콘텐츠가 연달아 추천된다.
결과적으로 우리는 원래보다 훨씬 극단적인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.
**“알고리즘은 내 선택”이 아니라
“알고리즘은 내 감정 자극 분석 결과”**일지도 모른다.
⸻
4. “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는가, 감정을 소비하는가”
정치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다.
이건 사업이다.
• 구독자 수에 따라 브랜드 협찬이 붙고
• 생방송 슈퍼챗으로 후원이 들어오고
•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직화하고
• 정치는 실제 여론에 영향을 준다
그리고 이 모든 기반은 분노, 혐오, 극단이라는
‘감정 에너지’에서 비롯된다.
그래서 우리는 묻는다.
“나는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걸까,
아니면 분노라는 감정을 유도당하고 있는 걸까?”
⸻
5. “정보인가, 무기인가” – 정치 콘텐츠의 두 얼굴
모든 정치 콘텐츠가 악의적이진 않다.
좋은 콘텐츠는
• 정책을 해설하고
• 토론을 장려하며
• 다른 시각을 소개하고
• 민주주의에 기여한다
그러나 문제는,
“수익이 되는 콘텐츠”가 “좋은 콘텐츠”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.
플랫폼은 윤리보다 클릭을 보상한다.
광고주는 가치보다 트래픽을 산다.
그리고 우리는 선택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게 된다.
⸻
그리고 다시 묻는다
“정치 유튜브는 왜 돈이 될까?”
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.
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고,
무엇에 분노하며,
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.
⸻
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
우리는 정치 콘텐츠를 본 걸까요?
아니면 감정을 팔아 만든 수익 구조 속에서
그저 소비당한 걸까요.
'정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민주주의는 투표일까, 태도일까?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(0) | 2025.05.11 |
|---|---|
| 사실은 진실일까? 정보의 시대,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(0) | 2025.05.11 |
| 법이 정치보다 강할 수 있는가? 정치가 무너진 자리, 법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(0) | 2025.05.11 |
| “정치가 흔들릴 때, 국민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”– 대선 혼란 속,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(0) | 2025.05.11 |



